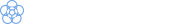Webzine 제11호
-


이땅에서 문화원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


문화원연합회 방향과 전망 -


지방문화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정책 제언 -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사명 -


지방문화원 어르신 사업 담론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문화정책의 흐름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문화원의 새길찾기 -


경기도지역 어르신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


공위기(空位期)시대의 지방문화원 -


21세기 지방문화원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지방문화원 ‘지역학’연구 중심 역할해야 -


꿀벌들을 춤추게 하라 -


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길 -


지방문화브랜드사업 예산 확보 고민해야 -


고전문학을 통해서 보는 고양이야기 -


다시 명성황후 시해일을 눈 앞에 두고 -


둔배미 배치기 소리의 소멸 위기에 대한 유감 -


복사골은 새로운 아침을 노래한다 -


시흥과 시흥시 그리고 시흥문화 -


이담골을 아십니까? -


문화원이 지역의 정신적 지주 역할 해야 -


우리 -


정체하는 지방문화원, 돌파구를 찾아서 -


문화인의 길 -


지방문화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


지역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라 -


경기도 문화자원의 활용과 비전 -


조수기 의정부원장님
- <칼럼/서평> <사업>
- 지역, 지역문화 그리고 지방문화원다시 명성황후 시해일을 눈 앞에 두고
-



-
조성문(여주문화원 사무국장)지난달 31일 일본의 극우파 신문인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교행위를 두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사대주의를 일삼는 이유는 민족의 나쁜 유산 때문”이라면서 “조선말기, 청나라에서 일본, 일본에서 러시아로 사대국을 가볍게 바꾸어 간 DNA를 계승하는 한국의 훌륭한 ‘사대 방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선에는 박대통령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며 “민비가 일본과 외교조약을 체결한 후 청군에 기대고 나중엔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다가 암살된다”고 조롱했다.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의 망발이 도를 넘고 있지만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저들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우리의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극일(克日)이자 승일(勝日)의 첩경이라 믿기 때문이다.명성황후는 1851년 11월17일 여주시 능현동에서 태어났다. 아득한 옛날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에 명성황후는 잊혀진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다. 그러나 우리 곁에 명성황후는 없다.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짓고 민가마을과 감고당을 들어앉혔어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던 그 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명성황후의 그 기개를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여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1998년 이영숙 회장의 도움으로 명성황후 진영이 생가에 봉안된 이후, 여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명성황후 기념행사가 15회째 이어지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숭모제(11월 17일)를,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추모제(10월 8일)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숭모제를 거행하였다. 겉으로 나타나듯이 행사의 일관성이 없었으며 내용면에서도 크게 자랑할 것이 없었다. 이를 먼저 반성한다.행사를 떠나 생가운영 전반을 일별해 보더라도 총체적 어려움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다. 생가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2012년에 16만 2천명, 2013년에 14만 7천명, 2014년에 13만 6천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에서다. 우리의 무관심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는 우리 여주이기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숭모제든 추모제든 명성황후가 중심이 되는 문화제를 여주인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 명성황후의 정신이 살아있는 생가가 되어야 한다. 여주 3대 관광지중에서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의 능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신륵사는 조계종이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명성황후생가만이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명성황후의 역사적 방점은 황후의 비극적 죽음에 있다. 1895년 10월8일 일본의 잔악한 칼날에 황후가 시해를 당한 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1910년 조선의 멸망 위에 총독부가 섰다. 이후 35년간의 치욕적인 식민지 지배가 이어졌고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5년간 좌우대립의 혼란 속에서 1950년 동족상잔의 6·25를 촉발시켰고 1953년 정전이후 분단의 아픔을 안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명성황후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이다.그러므로 명성황후 시해의 처음과 끝을 낱낱이 밝혀서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불의에 대한 세계사적 징치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끝에 명성황후가 못 다한 새로운 개화, 새로운 구국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 그 미래에서 명성황후시해의 비극과 식민지의 설움과 분단의 아픔과 지금껏 우리에게 쏟아지는 저들의 조롱이 스러질 수 있다. 명성황후 시해 120주기를 눈앞에 두고 새롭게 각성하여 명성황후의 삶과 정신을 가슴에 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내는 여주인들을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