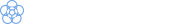- <현장> <사업>
- ‘공유도시’로 가는 길로서의 ‘살롱’
-



-
정기황 | 시시한연구소 소장
왜 머나먼 프랑스에서 ‘살롱(Salon)’이라는 문화를 도입했을까? 왜 공공의 중간지원조직인 문화재단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살롱문화’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걸까? 살롱문화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아고라(Agora) 주변의 회랑에 앉아 공적 논쟁과 토론을 하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아테네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도시(Polis)를 “공동체로서의 ‘폴리스’란 말은 공동체 내에서 상이한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리하는 이해 상관성을 지향하는 집단 형성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것으로 묶여지고, 친애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갈등은 필연적이고, 이에 따른 공적 논쟁과 토론 또한 필연적이다. 이는 ‘살롱’과 같은 작은 공유공간과 ‘광장’과 같은 커다란 공유공간은 도시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살롱(문화)의 핵심은 공적 논쟁과 토론이라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유공간이라는 점이다. 한국 그리고 춘천에서 살롱문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한국 도시에 공적 논쟁·토론이 가능한 공유공간이 부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 살롱문화와 같은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는 ‘계(契)’라는 기원이 불확실할 정도로 오래된 보편적 문화가 존재해 왔다. ‘계(契)’는 상호부조와 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정치·경제·복지·종교·교육·오락 등 다양한 범주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춘천과 같이 카페 중심의 친목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는 시와 문장을 지어 서로 나누는 시계(詩契) 등이 있었다. 하지만 계는 살롱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자체나 전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정한 이해나 여러 가지 이해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살롱은 공유공간, 계는 공유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고, 살롱과 계는 마을이나 도시적 차원의 공동체라기보다 이익집단이나 기능집단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춘천에서 말하는 ‘도시가 살롱’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춘천문화재단에서 발간한 『도시가 살롱: 내 취향의 이웃을 만나는 작은 공간』(달아실 2023)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잘 나타나듯 살롱이 ‘취향 집단의 교류 공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도시 전체의 교류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가 살롱’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지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체적인 공유공간의 확보와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각각의 살롱의 연대와 이를 통한 공적영역에의 개입과 참여이다. 즉 시민들 스스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자리하는 것이다.
‘공유(共有)’는 ‘커먼즈(Commons)’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국에서 ‘공유’는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다. 현재 공유는 ‘쉐어링(Sharing)’의 의미로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는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사용하는 규칙을 만들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유’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공동체적 삶에 필연적 조건이었다. 왜 이런 공유문화는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을까? 세계적인 흐름으로는 1968년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공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유지(Commons)는 황폐화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통제 강화와 사유화라는 답을 내놓으면서다. 하딘의 이런 논리는 근현대국가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인류가 공동체의 파멸을 선택한 적이 없고, 공동체가 자치제도와 협력체계를 통해 공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딘의 논문에 반박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2009)했다. 이는 하딘의 논리가 국가만능주의, 행정만능주의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사유화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문제를 야기했고, 공유문화가 필요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하딘의 논리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는 사유화의 방법을 채택함으로 불로소득을 통한 빈부격차, 양극화 등의 문제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시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건물주’라고 말하는 실정에 이르러 있다. 현재 한국은 정부가 소유한 국공유(國公有)지가 약 30%이고, 개인이 소유한 사유(私有)지가 약 70%로 국공유지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유지 소유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약 55%, 한국 전체 토지의 약 40%를 소유해 상위 1%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많은 수준이다. 해방 직후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비율이 약 60% 대 40%였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정부의 통제 강화와 사유화를 통해 공공이익을 실현하기보다 정부 소유와 개인 소유의 사적 소유권만을 강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대 담론으로 여겨질 수 있고, 살롱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사유화 과정은 공동체가 기반으로 하던 공동자원을 소멸시키며 만들어졌고, 토지와 공간의 사용가치를 온전히 교환가치로 전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나 공유문화 소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터전이자 논의의 장(場)인 공동자원으로서 공유공간의 소멸은 공동체, 마을, 지역, 도시를 만들고, 사용하고, 책임지는 주체인 시민의 권한과 권리를 소멸시키며, 시민을 도시의 단순 소비자로서 전락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이런 문제는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팬데믹 초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인 소유의 주거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고, 우선적으로 공공공간과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였다.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서민 등 주거약자는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열악한 주거공간을 보완하던 공공공간이 폐쇄되자 시민들의 활동공간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도서관에서 카페로, 체육시설에서 공터로 온전히 사적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장애인 활동지원조차 멈추면서 장애인의 생존까지 위협받았고,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조차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양극화된 주거 공간의 문제를 드러냈고, 공공공간과 공유공간과 시민사회의 상호돌봄의 필요를 절실하게 확인했다. 이는 팬데믹 시대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상위, 행복지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한국 사회가 위기의 시대임을 보여준다. 이런 사회적 문제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외로움(고립감)’이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문화와 소통의 장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노인이 아이를 돌보고, 청년이 노인을 돌보고, 자연은 도시를 돌보고, 농촌은 자연을 돌보는 상호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춘천에서 살롱이 팬데믹 시대에 시작된 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그 절실한 필요의 발현일 것이다. 춘천에서 ‘취향’은 그저 무용한 잉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기반이 되었고, ‘살롱’은 이들의 소통의 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즉, 팬데믹 시대 춘천의 살롱은 사적인 사유지가 아니라 상호돌봄을 실현한 공적인 공유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유(Commons)가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공유의 방법이 존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와 춘천의 현재에 맞는 공유 방법의 실험이 필요하다. 춘천의 살롱문화는 이주자가 많고, 카페 등 소통 공간이 많아지는 현재 춘천에서 취향을 기반으로 한 공유공간의 확장으로서 공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공공의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살롱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유공간의 필요에 대한 활동 주체들의 공감대와 절실함이 필요하다.
 영국 의회 / 출처: UK Parliament(Members of the UK Youth Parliament take their seats), www.flickr.com
영국 의회 / 출처: UK Parliament(Members of the UK Youth Parliament take their seats), www.flickr.com이런 공유공간과 관련해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언이 있다. 이 명언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이 1943년 10월 28일 세계대전 중 런던 폭격으로 폭파된 영국 하원의 재건을 위한 연설에서 한 말이다. 이는 서로를 가까이에서 마주 보고, 토론하는 작고 좁은 ‘하원 공간(Chamber)’을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의 일부였다. 이어 처칠은 “하원은 우리의 업무를 기계적인 공론장에서 인간적인 공론장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주장했다. 처칠은 ‘인간성의 회복’을 중요한 가치라 여겼기 때문이고, 이에 공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은 하원을 ‘House of Commons’으로 지칭한다. 시민들을 대의하는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규칙을 정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처칠의 명언은 단지 하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가까이에서 토론하는 공론장’은 공동체, 마을, 지역, 도시 등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더 나아가 도시적 차원에서는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라는 유명한 슬로건이 있다. 1968년 프랑스의 68혁명 당시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권)’를 주장한 것이었고, 도시 주체로서의 시민이 스스로 도시공간을 생산하며, 구체적인 인권을 쟁취해 삶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유엔에서 각국에 권장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 가치가 되어 있다. ‘도시권’은 돈 미첼(Dom Mitchell)이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저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공간을 생산하는 권리에 대한 투쟁’이다. 이들이 공간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공간은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고, 권리 투쟁은 시민의 삶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다. 도시는 이런 공간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야만 한다. 영국의 브리스톨 시는 최근에 ‘2050 저탄소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와 무관하게 이 프로젝트는 도시를 만드는 공간 생산 주체로서 시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프로젝트는 적극적인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저탄소 도시(Scenario X)와 에너지의 최소 사용 실천을 통한 저탄소 도시(Scenario Y)라는 2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도시의 방향을 수렴해 시민들이 미래도시의 주체로서 계획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함께 미래도시의 모습을 결정하고, 이 미래도시로 가기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미래도시는 기후 위기 살롱, 자전거 살롱, 정원 살롱 등에 형성된 공감대의 기반 위에 그 다양한 살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도시(춘천)가 살롱’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의 미래상이 필요하고, 그 미래상을 함께 그려갈 살롱, 살롱에 모인 각각의 시민이 함께할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필요하다.
 2050 브리스톨 저탄소 도시 프로젝트 / 출처: www.futurebristol.co.uk
2050 브리스톨 저탄소 도시 프로젝트 / 출처: www.futurebristol.co.uk한국에서 공유도시로 가는 길은 새로운 실험의 연속으로서 실패를 쌓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춘천은 앞으로도 ‘살롱은 공유(커먼즈)공간인가?’, ‘춘천은 공유(커먼즈)도시인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며,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만 한다. 공유(Commons)는 국가나 광역 단위의 보편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된 특정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르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유화 과정(Commoning)의 일시적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