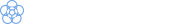- <칼럼/서평> <정책/이슈>
-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



-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건 대부분 소음이다.
우리가 소음을 귀찮아한다면 소음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한다면 소음이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드디어 알게 된다.
소음이야말로 경이로운 음악, 가장 자연스러운 음악이다.”
_ 존 케이지소음이 아니다. 거기서 경이로운 음악을 들어라!
1952년 8월 29일, 뉴욕 우드스톡의 숲속 야외공연장에 한 연주자가 등장한다. 그는 청중에게 인사를 하고는 피아노 의자에 앉는다. 피아노 위에는 악보가 놓여 있고 그는 왼손에 회중시계를 쥐고 있다. 이제 연주를 시작해야 하는 타임.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피아노 뚜껑을 닫는다. 침묵이 흐른다. 10초, 20초, 30초, 1분이 넘어서도 피아노 건반 하나 울리지 않는다. 무거운 정적 속에 객석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 4분 33초가 지나자 연주자는 말없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간다. 이날 발표된 곡의 이름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가 작곡한 [4분33초]. 연주자는 데이빗 튜더(David Tuder).
이 곡의 악보를 살펴보자. 3악장으로 구성된 악보에는 음표 하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악장마다 ‘타셋’(Tacet, 조용히)이라는 단어와 연주되는 시간만 씌어 있을 뿐이다. 케이지는 이 곡에서 무얼 의도했던 것일까?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아니 그가 연주를 하지 않는 동안, 그 사이에 청중에게 들린 모든 소리가 그의 곡으로 들어온다. 공연장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 바람에 나뭇잎이 나부끼는 소리(33초), 공연장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2분40초), 그리고 당황하는 청중의 수군거리는 소리, 팸플릿을 구겨버리는 소리, 심지어 나사가 빠져 삐걱이는 의자의 쇳소리(1분20초)마저도 이제 새로운 음악으로 발견된다. 베를린 필의 키릴 페트렌코가 3악장 타셋을 시작하고 있다.
베를린 필의 키릴 페트렌코가 3악장 타셋을 시작하고 있다.2020년 10월 31일 독일 베를린필의 콘서트홀에 수석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Kirill Petrenko)가 등장한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독일과 지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 콘서트홀 폐쇄를 앞둔 시점이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존 케이지의 ‘4분33초’를 지휘하기 시작한다. 그의 손끝, 눈빛과 동작, 얼굴 주름과 표정 하나하나가 침묵 속에서 섬세하게 읽힌다. 그의 손과 동작은 분명히 새로운 악장이 시작될 때마다 단원들에게 무언가를 끌어내려는 듯 다시 위를 향한다. 세 악장 모두 그가 지시하려고 하는 것은 ‘침묵’이다.
악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연주하지 말라는 지시일까? 타셋은 본래 ‘쉬라’는 뜻이다. 연주를 멈추고 쉬어라. 소리를 내지 말고 쉬어라. 이제부터는 제발 너 이외의 소리에, 너의 주변에 있는 작은 소리에, 너의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요청이다. 그래서 타셋은 ‘안식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음악은 연주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악기를 내려놓을 때 듣게 되는 소리, 음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온 소음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거기서 우리는 이제껏 몰랐던 경이로운 음악과 만나게 된다.‘4분33초’는 이 곡이 연주되는 273초 동안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우연한’ 소리들이 다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곡은 연주될 때마다 어떤 곡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늘 새로운 음악이다. 그렇다면 페트렌코가 이날 존 케이지의 ‘4분33초’를 연주한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을 단숨에 잠식해버렸다. 사람들과의 접촉과 이동이 금지되고 모든 연주가 멈춰지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한다. 하지만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음악이 연주되고 있음을 문득 깨닫는다. 우리가 겪고있는 이 기간은 4분 33초 안에서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우리가 그동안 소음이라고 귀찮아했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존재하는 것이다. 페트렌코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타셋’을 요청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상상초월’ 기억저장소가 있다
 그의 지하실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의 작품을 꺼내 보여주는 피터 안톤
그의 지하실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의 작품을 꺼내 보여주는 피터 안톤2015년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에 출품된 [피터의 상상초월 작업실](2014, 원제 Almost there). 이 영화는 아카이브를 고민해온 내게 충격 그 자체였다. 주인공 ‘피터’는 미국 인디애나주 작은 마을에 사는 병약한 노인이다. 그의 집은 난방도 되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 2명의 다큐 감독들이 처음 그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보게 된 기막힌 광경. 마룻바닥은 죄다 썩었고 집안은 천정까지 쓰레기로 가득 뒤덮여 있었다. 게다가 집안 구석구석엔 곰팡이가 피었고 악취가 진동한다.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인 집이다.
그런데 감독들은 피터의 지하실에서 8년씩이나 쓰레기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해왔다. 대체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 노인의 좁고 칙칙한 지하실 쓰레기 더미에서 그의 삶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꺼내고 복원하는 작업이 이 다큐의 주된 내용이다. 이 다큐는 한 개인이 가진 기억의 지층을 발굴하는 장대한 고고학적 탐구라고 할 수 있다. 별 볼 일 없는 한 시골 노인이 칩거해온, 기이한 공간에 대한 탐구 과정, 그의 생각 속으로의 길고 긴 여행이다.제임스 조이스의 장편소설 『율리시스』(1922)는 주인공 ‘블롬’이 더블린 시내를 배회하면서 겪는 단 하루 동안의 일들을 보여준다. 그에게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 그가 회상하는 길고 긴 정신의 여정은 이제 트로이전쟁의 영웅 율리시스가 십년 동안 바다에서 겪었던 모험담으로 격상된다. 피터는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이 만든 조크 북(Joke Book)을 내민다. 뒤이어 그가 평생에 걸쳐 기록해온 스크랩북을 꺼내 보여준다. 그가 그린 수백 장의 삽화와 스케치, 잡다한 메모지,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낸 온갖 종류의 수집물들을 마주하는 순간, 감독들은 이 초라한 노인의 삶에 숨겨진 압도적인 ‘상상초월’을 경험한다. 블롬이 율리시스로 격상된 것처럼, 노인도 홀연히 거장의 모습으로 감독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경험은 아키비스트가 지역을 탐구할 때 꼭 만났으면 하는 그런 경이로운 세계와의 만남이다. 무엇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가? 피터가 홀로 추구해온 예술세계다. 이제까지 그 어떤 관객이나 독자의 시선에도 닿아본 적이 없는, 날것 그대로의 예술세계가 여기 지하실에 있다. 이것은 누군가 라스코 동굴에 우연히 횃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동굴 벽에 그려진, 수천 년 전 들소 벽화를 처음 보게 된 순간 느끼는 전율과 비슷하지 않을까?피터라는 한 인간을 향한 두 감독의 기다림도 ‘상상초월’이다. 8년간이나 걸린 그들의 끈기 있는 시선, 개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 감독들은 우선 자신의 전문가성을 내려놓는다. 그런 우월적 지위와 권력성은 인간을 쉽게 대상화시키고 부지불식간에 한 개인의 삶에 폭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을 발견하는 일은 자신의 우월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세계다. 지역을 발견하는 일도 그렇다. 수많은 일상의 ‘피터’들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다큐에서 가장 빛나는 ‘상상초월’은 삶의 진실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진실은 언제나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이 숨어 있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다큐에서 진실은 ‘피터’라는 보잘것없는 사람 속에 숨어 있다. 진실은 악취와 더러움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에(변복을 하고 있어서) 그 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진실이 발견되는 장소는 이상하게도 고상한 장소가 아니라 늘 쓰레기 더미 속에서다. 전문가는 섣불리 개입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고 사태를 단숨에 평정하려 든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개입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것이 피터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피터를 존중한다면 전문성을 내려놓고 피터의 세계에 맨몸으로 들어가야 한다.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들의 기억,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잡다하고 냄새나는 쓰레기가 아니다. 우리가 마을 주민과 그들이 가진 기억에서 그런 경이로움을 발견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삶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끈기 있고 애정 어린 시선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개인이 모아놓은 잡다한 물건들이 이제는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면 벌써 좋은 조짐이다. 그 물건들이 그 지역 주민의 인생 장면들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터의 냄새나는 지하실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다. 이제 그 지하실을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작업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다. 우리의 숨겨진 의도, 욕구, 목표를 내려놓고서 말이다.
밤섬 부군당(府君堂) 이야기가 묻는 것
1968년 2월 10일, 주요 신문들이 전하는 기사 제목들. ‘오늘 오후 3시 밤섬 폭파’, ‘자취 감출 신비의 마을 밤섬’, ‘근대화에 밀려 수장되는 한강 섬마을 밤섬 폭파’……. 밤섬은 서울 여의도 옆에 있는 섬이다. 한때는 인천과 한양을 잇는 거점으로 수많은 배들이 몰려 전성기를 구가했건만 1960년대 말까지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었다. 그래도 주민들은 호롱불과 한강물을 길어 쓰며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 살고 있었다. 밤섬에는 오래전부터 ‘부군당(府君堂)’이라는 마을제당이 있는데 정월 초이튿날이면 이곳에서 마을굿을 열고 밤섬 사람들의 무사안녕을 빈다.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대한늬우스](662호)가 보기에는 몹시 원시적이고 미신을 좇는 일로 여겨졌던 모양이다.
 2014년 8월 밤섬귀향제에서 부군당굿을 펼치는 주민들
2014년 8월 밤섬귀향제에서 부군당굿을 펼치는 주민들밤섬 폭파는 여의도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아직도 무당, 미신을 믿고 있는 밤섬 마을을 해체해서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 생활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되었다. 이러다 보니 밤섬 주민들은 별안간 짐을 싸서 마포 와우산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섬은 이튿날 군사작전 하듯 강력 폭약(TNT)으로 폭파되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62가구 443명의 밤섬 사람들은 섬을 떠날 때 부군당 신령들을 모두 모시고 떠났고, 와우산에 정착해서도 다시 산 위에 마을제당을 세워 거기에다 신령들을 모셨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빠짐없이 부군당굿을 지냈다. 자녀들이 마을굿을 미신으로 교육받으면서 당굿 참여 가구가 줄어들어도,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엄중한 단속에도,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도 굿을 이어갔다.
부군당굿은 밤섬 사람들에겐 정신적 구심점이자 자존심 같은 것이었다. 부군당굿은 1970년대 미신 타파를 내세운 새마을운동의 기나긴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 남았다. 매년 음력 1월 2일이면 와우산 창전동에 정착한 주민 이외에도 먼 곳으로 흩어진 이주민까지 이곳 부군당으로 모인다. 굿을 진행하는 동안 당주무당은 과거 마을에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를 불러들인다. 그들의 성격, 특징, 말투, 사건을 세세히 풀어내면서 당주무당의 기억 속에 저장된 망자의 삶이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되면, 이를 지켜보던 후손인 주민은 “맞네. 우리 아버지 얘기네” 하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굿판에 뛰어든다. 그리곤 그동안 묵혀둔 애환을 절절히 쏟아낸다. 그 사이에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자식 키우느라 애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동안 단절된 시간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이다.무당의 말과 행동을 보며 주민들은 과거 밤섬에 함께 살던 기억 속의 이웃들을 만난다. 마을구판장 앞에 나와 항상 곰방대 담배를 태우시던 할아버지, 이른 새벽 마을을 한 바퀴씩 도시던 호랑이 할머니 등 외부인은 모르지만, 밤섬 사람이라면 다 알던, 오래전 작고한 망자들을 무당을 통해 만나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굿판에서 벌어지는 과거와 현재의 이런 극적인 해후야말로 살아 있는 아카이브의 생명성이 아닐까? 부군당굿을 통해 오래전 폭파된 밤섬 마을은 다시 오늘날 2022년 현재의 시점으로 호출된다. 마을의 역사가 단절된 그 시점부터 어떻게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민들의 기억이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죄다 이 굿판을 통해 하나가 된다.
부군당굿은 밤섬 마을의 오래된 서사를 담고 있지만 원형만을 보존하려고 집착하지 않는다. 밤섬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꿋꿋이 살아온 후손들의 이야기가 그 서사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시대 변화 속에서도 구슬처럼 반짝이고 있는 개인의 삶이 굿을 통해 하나로 꿰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을 후손들이 앞으로도 자유롭게 이 굿판에 개입하고 서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한때는 여의도 개발을 위해 폭파되어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밤섬이 2012년 6월 21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고, 전근대적 미신으로 비난받던 밤섬 부군당굿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일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놀라운 장면 전환은 어쩌면 주민들이 그동안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부군신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개인의 기억, 개인의 아카이브는 그 자체로는 힘이 없다. 하지만 뿔뿔이 흩어졌던 그 기억들이 구슬 서말처럼 모아져 하나로 꿰어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주민들의 기억은 보배가 된다. 이 보배는 공동체의 자산이요, 사회적 자원, 그리고 지역이 함께 공유하는 커먼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구슬을 꿰어야 하는가? 바로 지역 아키비스트다.